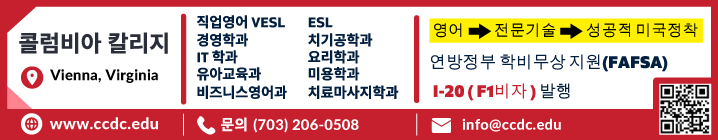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별세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카터 센터는 29일 오후 3시 45분쯤 카터가 조지아주 플레인스에 있는 자택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숨졌다고 밝혔다.
1977년부터 1981년까지 미국의 제39대 대통령을 지낸 카터는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가장 장수한 인물이다. 최근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이 간과 뇌로 전이되며 병환이 급격하게 악화해 지난해 2월부터 자택에서 호스피스 돌봄을 받고 있었다.
한편 향년 100세를 일기로 별세한 가운데 그의 한국과의 인연이 재조명되고 있다.
카터 전 대통령은 1977년 39대 미국 대통령으로 집권했다. 취임 초기에 그는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꺼내 들면서 박정희 정권과 ‘불협화음’을 냈다.
카터 전 대통령은 군사 정권에서의 인권 문제를 제기하며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3만여 명에 달했던 주한미군을 5년에 걸쳐 3단계로 철군하고 전술핵무기까지 철수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박 전 대통령은 “내정간섭”이라며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고, 베트남 전쟁에 파병하며 한미동맹에 기여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우가 아니라며 배신감을 표출하기도 했다.
추후 공개된 백악관 외교 문서에 따르면 1979년 6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철수와 인권 문제를 가지고 두 정상 간 거친 설전이 오가기도 했다.
방위비 분담금 이슈도 불거졌다. 카터 전 대통령이 북한은 국민총생산(GNP)의 20%를 군사비에 쓰는 것에 비해 한국의 방위비 기여도가 낮다고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박 전 대통령은 “북한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면 한국에선 폭동이 난다”라고 받아쳤고, 설전이 오간 끝에 가까스로 봉합됐다고 한다.
카터 전 대통령 퇴임 후 한국과의 인연은 집권 때와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이어진다. 그는 ‘평화의 전도사’를 자처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김일성 주석과 만나는 등 한반도 긴장 국면 때마다 ‘해결사’로 나섰다.
카터 전 대통령의 첫 방북은 1994년 6월에 이뤄졌다. 그는 1993년 3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로 1차 북핵 위기가 극에 달하자 그해 6월 김일성 주석과 담판을 짓겠다며 빌 클린턴 행정부에 방북을 요청했다.
카터 전 대통령은 3박 4일간 평양을 방문해 김 주석과 두 차례 면담해 긴장이 조성된 한반도 분위기를 완화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퇴임 후에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재임 시절보다 인기를 끌며 ‘대통령보다 나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그의 퇴임 후 행보가 차기 지도자들에게 귀감이 됐다고 평가했다.
1980년 재선에 실패했지만 퇴임 이후 1982년 부인 로잘린 여사와 함께 고향인 조지아주 플레인스 목장으로 돌아가 카터 센터를 설립, 40여 년을 인권 문제에 앞장서고 봉사활동을 하며 전 세계의 존경을 받았다.
이 같은 활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2년 카터 전 대통령은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노벨위원회는 국제 갈등의 평화적 해결책을 모색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하기 위해 그가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기사제공 = 하이유에스 코리아 제휴사,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