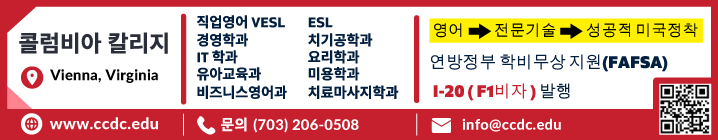1980년대 초 강남 어느 학교에서 보낸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모금하고 있다”는 가정 통지문을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다.
대한민국 부자들만 몰려 살고 있다는 강남 지역에서 도대체 어떤 급우가 있기에 성금을 모금하는지 궁금하여 알아보니 바로 ‘구룡마을’ 아이였다.
구룡산과 대모산 자락에 있는 구룡마을은 1970년대 말부터 도시정비 사업에서 밀려난 철거민들이 몰려 형성된 거대한 판자촌이다.
비닐과 판자로 엉성하게 지어져 있다 보니 화재사고와 수해도 자주 발생한다. 2009년부터 최소 16건의 화재와 1차례의 수해가 발생하여 철거민이 이재민이 되는 경우도 자주 있다.
지난 1월에도 화재로 인해 구룡마을에서는 44세대 68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서울시는 “현재 거주민 총 1107세대 중 567세대가 이주 완료했으며, 540세대가 남아 거주 중이다”이다고 밝히고 있다.
필자는 지난 14일, 마음먹고 구룡마을을 찾아봤다. 이번 방문은 1982년 이래 두 번째 방문이었다.
마을 주변에는 더 많이 들어선 고급 고층 아파트들이 가난한 마을을 우두커니 내려다보고 있었다.
2014년 11월 대형 화재가 났던 자리에는 노외 주차장이 들어서 있고 마을에는 지나다니는 주민만 간간히 보일뿐 개 한 마리조차 보이지 않는 적막강산이었다.
판자촌은 거의 다 빈집이었고 편의점, 세탁소 등 주민 편리 시설 앞에 쌓인 산업 폐기물들과 고급 외제차들이 ‘구룡마을’ 재개발을 알리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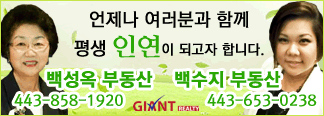

그동안 구룡마을 재개발 사업이 늦어진 이유는 서울시와 관할 강남구청, 그리고 토지주(국가, 개인)와 거주 세입자들 간 이익이 맞아떨어지지 않아서였다.
2011년 사울시는 공영개발 방식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발표했지만, 강남구와의 이견으로 개발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 1월의 화재를 계기로 강남구와 서울시가 서로 일부 양보하여 재개발에 탄력이 붙고 있다.
3월 30일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거주자들의 임시이주를 위한 보증금·임차료를 전면 지원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개포동 567-1 일대 구룡마을에 대한 토지 보상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시울시와 주민들 간 보상 협의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토지주들은 구룡마을 건너편 개포동 아파트 단지 수준으로 보상받기를 원하지만 SH는 감정평가에 따른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상할 방침이다. 또 거주민들은 재정착할 때 분양 전환 임대주택을 요구하고 있으나 서울시와 SH는 무허가 주택 거주자에게 아파트 분양권을 제공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어쨌거나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했다고 판단한 서울시와 SH는 올 10월까지 협의 계약과 이주 대책 공고 등 후속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잦은 재난으로 위험에 노출된 구룡마을 거주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조속한 이주와 도시개발사업을 빠르게 추진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구룡마을 전체가 텅 비고 있는 이유는 2011년 재개발 계획이 처음 수립된 후 12년 만에 사업이 구체화되자 주거와 소유권이 동시에 확보된 주민들이 하나 둘 씩 마을을 떠나고 있기 때문이었다.
구룡마을 자리에는 35층 이상의 3600가구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다.
그동안 정치 사회적으로 골치 덩어리였던 서울의 마지막 ‘판자촌’도 방배동 성뒤마을에 이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예정이다.
성뒤마을은 1960~1970년대 강남 개발에 따라 이주민이 정착하며 형성된 마을이다. 개포동 구룡마을과 함께 강남권 핵심 입지에 남은 마지막 판자촌이었다.
하이유에스코리아 강남중 기자